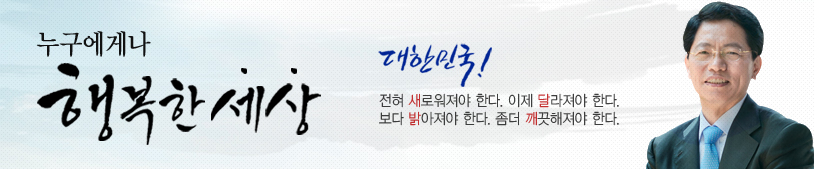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새해 첫날에 창문을 열고
정축년(丁丑年) 새해가 밝았다. 창문을 활짝 열고 먼저 법원가족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린다. 새해가 소띠해인지라 생각나는 시(노래 가사) 중에 정지용(1902-1950 : 1988년 해금 시까지 우리는 ‘정○용’으로 배웠다)이 22세 때 지은 ‘향수(鄕愁)’가 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즐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가 그런 것처럼 황소가 ‘얼룩백이’여서 필자로서는 불만이지만, 우리들 모두는 소띠 해 새해 아침에 그런 고향이 생각 날 것이다. 이제 새해부터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리들의 고향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황소처럼 일할 영장전담법관이 20여분 탄생하였다. 우선 초대 영장전담법관이 되신 판사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영장전담법관은 관할지역 전체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전담(전문적으로 담당하면 專擔이고 전부 담당하면 全擔이리라)하지만 수사기관이나 국민 또는 언론이 쏘아대는 십자포화를 또한 전담(全擔)하여야 한다. 매일 수차례 재판(심문)을 해야 하고 하루에 10-20명의 구속 여부를 혼자 결정해야 하니 정말 외롭고 고달픈 일을 전담(고통전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로서는 위로(?)의 인사도 드려야 할 것 같다. 영장전담법관은 이제 피의자 나아가 국민과 최단거리에서 그들의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삶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접하게 되며 그들의 눈에 맺힌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고 그 문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동안 법관은 수사기록이라는 창문, 그것도 누군가에 의하여 채색된 창문, 아니면 원래의 빛을 굴절시키는 글한 반투명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그 너머 방안에 앉아서 추운 바깥에서 떨고 있는 피의자를 바라만 보았지 그 창문을 열고 피의자를 만나볼 수 없었다. 새해에는 그 창문이 열린 것이다. 그들의 눈물을 바로 바라보고 닦아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의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왜 창문을 열어야 하는가. 이 추운 겨울에 창문을 열면 어떻게 하라고. 정ㅈ;용의 시 중에 <춘설(春雪)>이라는 시가 있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창문은 따뜻한 방안가 차가운 바깥의 경계를 이루는 물상(物象)이다. 겨우내 닫혀 있던 방안에서 창문을 여는 순간 비로소 구체적 사물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장 폴 샤르트르(Jean Paul Sartre : 1905-1980)는 인식 이전에 사물로 있던 것이 인식으로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무(無)의 상태에서 사물을 깨우는 것이 인간이며 잠재적 사물의 혼돈 상태에서 구체적 사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의식이라고 하였다. 사물이 의식을 만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판사가 창문을 열기 전에는 피의자는 판사에게 존재가 되지 못하고 다만 습관적인 ‘거기 있음’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판사가 창문을 열었을 때 느끼는 그 차가운 인지(認知)의 순간 비로소 세상은 실재하는 대상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창문을 열어 차가움을 느끼는 그 순간은 바로 사물을 인식에 의해서 존재로 회생(回生)시키는 순간이 아니던가. 이제부터는 구속이라는 궂은일을 판사가 해야 한다. 판사는 바깥 공기가 차더라도 과감히 창문을 열어야 한다. 필자는 여기에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사가 창문을 열고 피의자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일이다. 사실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전인격적 결단이라 할 수 있는데, 판사가 피의자심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간의 심리나 삶의 모습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이 길러질 것임은 자명한 것 아닐까. 아무리 중죄인이더라도 또 수사기록상 구속의 사유가 나무나 분명하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한마디 호소라도 들어주고 추위에 고생이 많을지도 모르겠다고 위로해 주는 것이 판사의 당연한 책무가 아닐까. 다시 한번 영장전담법관님들께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드린다. (1997년 1월 1일자 법원회보)
정축년(丁丑年) 새해가 밝았다. 창문을 활짝 열고 먼저 법원가족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린다. 새해가 소띠해인지라 생각나는 시(노래 가사) 중에 정지용(1902-1950 : 1988년 해금 시까지 우리는 ‘정○용’으로 배웠다)이 22세 때 지은 ‘향수(鄕愁)’가 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즐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가 그런 것처럼 황소가 ‘얼룩백이’여서 필자로서는 불만이지만, 우리들 모두는 소띠 해 새해 아침에 그런 고향이 생각 날 것이다. 이제 새해부터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리들의 고향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황소처럼 일할 영장전담법관이 20여분 탄생하였다. 우선 초대 영장전담법관이 되신 판사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영장전담법관은 관할지역 전체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전담(전문적으로 담당하면 專擔이고 전부 담당하면 全擔이리라)하지만 수사기관이나 국민 또는 언론이 쏘아대는 십자포화를 또한 전담(全擔)하여야 한다. 매일 수차례 재판(심문)을 해야 하고 하루에 10-20명의 구속 여부를 혼자 결정해야 하니 정말 외롭고 고달픈 일을 전담(고통전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로서는 위로(?)의 인사도 드려야 할 것 같다. 영장전담법관은 이제 피의자 나아가 국민과 최단거리에서 그들의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삶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접하게 되며 그들의 눈에 맺힌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고 그 문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동안 법관은 수사기록이라는 창문, 그것도 누군가에 의하여 채색된 창문, 아니면 원래의 빛을 굴절시키는 글한 반투명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그 너머 방안에 앉아서 추운 바깥에서 떨고 있는 피의자를 바라만 보았지 그 창문을 열고 피의자를 만나볼 수 없었다. 새해에는 그 창문이 열린 것이다. 그들의 눈물을 바로 바라보고 닦아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의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왜 창문을 열어야 하는가. 이 추운 겨울에 창문을 열면 어떻게 하라고. 정ㅈ;용의 시 중에 <춘설(春雪)>이라는 시가 있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창문은 따뜻한 방안가 차가운 바깥의 경계를 이루는 물상(物象)이다. 겨우내 닫혀 있던 방안에서 창문을 여는 순간 비로소 구체적 사물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장 폴 샤르트르(Jean Paul Sartre : 1905-1980)는 인식 이전에 사물로 있던 것이 인식으로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무(無)의 상태에서 사물을 깨우는 것이 인간이며 잠재적 사물의 혼돈 상태에서 구체적 사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의식이라고 하였다. 사물이 의식을 만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판사가 창문을 열기 전에는 피의자는 판사에게 존재가 되지 못하고 다만 습관적인 ‘거기 있음’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판사가 창문을 열었을 때 느끼는 그 차가운 인지(認知)의 순간 비로소 세상은 실재하는 대상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창문을 열어 차가움을 느끼는 그 순간은 바로 사물을 인식에 의해서 존재로 회생(回生)시키는 순간이 아니던가. 이제부터는 구속이라는 궂은일을 판사가 해야 한다. 판사는 바깥 공기가 차더라도 과감히 창문을 열어야 한다. 필자는 여기에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사가 창문을 열고 피의자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일이다. 사실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전인격적 결단이라 할 수 있는데, 판사가 피의자심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간의 심리나 삶의 모습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이 길러질 것임은 자명한 것 아닐까. 아무리 중죄인이더라도 또 수사기록상 구속의 사유가 나무나 분명하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한마디 호소라도 들어주고 추위에 고생이 많을지도 모르겠다고 위로해 주는 것이 판사의 당연한 책무가 아닐까. 다시 한번 영장전담법관님들께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드린다. (1997년 1월 1일자 법원회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