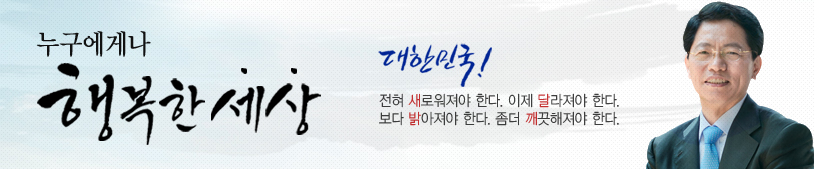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사이프러스의 기도
1988년과 2018년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나는 만삭의 아내와 함께 잠실벌에 있었다. 인기 스포츠 표를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기억이 난다. 당시 뱃속에 있던 아이는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기다리는 대학생이 되었다. 세월이 빠르다는 말은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서 더욱 실감한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쑥쑥 자라기 시작했다. 마치 오이나 대나무가 자라듯이 말이다. 키가 자라고 살이 붙더니 어느새 어깨가 쩍 벌어진 씩씩한 청년이 되었다.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따로 없다. 2018년 평창올림픽의 낭보가 전해졌을 때, 나는 나보다 10센티미터나 큰 아들과 함께 호프집에 있었다. “아빠” 하고 부르며 따라다니던 녀석이 굵고 듬직한 목소리로 “아버지, 맥주 한 잔 하시죠.” 하면 내 오금이 저린다. “축하한다. 아빠에게 88서울올림픽이 있었어. 너에게는 2018평창올림픽이 있겠구나.” 나의 1988년과 아들의 2018년 사이. 만 30년, 한 세대 차이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대로가 뚫렸다. 1987년 6․10민주항쟁과 6․29선언에 이어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현행 ‘1987년 헌법’이 탄생하였다. 올림픽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필연적 과정이었다. 88올림픽 후 필자 개인적으로는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 경제는 탄력을 받았다. 1997년의 IMF금융위기를 넘어서고 2002년 월드컵 성공 신화로 이어졌다. 이제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던 겨울올림픽까지 유치하였다. 우리나라는 결코 실기(失機)하지 않고 역사적 이벤트를 적기(適期)에 개최하면서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서듯이 발전하였다. 곡선 그래프로 완만하게 성장하기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로켓이 단계별로 엔진을 점화함으로써 새로운 추동력을 얻어 거듭 상승하듯이, 대나무가 마디를 단단하게 지으며 하늘로 뻗어가듯이 말이다. 이렇게 ‘단절적 비약’으로 이루어진 국운 상승의 역사가 대한민국 현대사이다. 그런데 2011년의 현실은 녹녹치 않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나의 아들은 결혼을 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될까? 우리나라는 2028년이나 2032년의 여름올림픽을 다시 개최할 수 있게 될까? 아직은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2011년 7월 13일자 매일경제>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나는 만삭의 아내와 함께 잠실벌에 있었다. 인기 스포츠 표를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기억이 난다. 당시 뱃속에 있던 아이는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기다리는 대학생이 되었다. 세월이 빠르다는 말은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서 더욱 실감한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쑥쑥 자라기 시작했다. 마치 오이나 대나무가 자라듯이 말이다. 키가 자라고 살이 붙더니 어느새 어깨가 쩍 벌어진 씩씩한 청년이 되었다.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따로 없다. 2018년 평창올림픽의 낭보가 전해졌을 때, 나는 나보다 10센티미터나 큰 아들과 함께 호프집에 있었다. “아빠” 하고 부르며 따라다니던 녀석이 굵고 듬직한 목소리로 “아버지, 맥주 한 잔 하시죠.” 하면 내 오금이 저린다. “축하한다. 아빠에게 88서울올림픽이 있었어. 너에게는 2018평창올림픽이 있겠구나.” 나의 1988년과 아들의 2018년 사이. 만 30년, 한 세대 차이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대로가 뚫렸다. 1987년 6․10민주항쟁과 6․29선언에 이어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현행 ‘1987년 헌법’이 탄생하였다. 올림픽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필연적 과정이었다. 88올림픽 후 필자 개인적으로는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 경제는 탄력을 받았다. 1997년의 IMF금융위기를 넘어서고 2002년 월드컵 성공 신화로 이어졌다. 이제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던 겨울올림픽까지 유치하였다. 우리나라는 결코 실기(失機)하지 않고 역사적 이벤트를 적기(適期)에 개최하면서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서듯이 발전하였다. 곡선 그래프로 완만하게 성장하기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로켓이 단계별로 엔진을 점화함으로써 새로운 추동력을 얻어 거듭 상승하듯이, 대나무가 마디를 단단하게 지으며 하늘로 뻗어가듯이 말이다. 이렇게 ‘단절적 비약’으로 이루어진 국운 상승의 역사가 대한민국 현대사이다. 그런데 2011년의 현실은 녹녹치 않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나의 아들은 결혼을 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될까? 우리나라는 2028년이나 2032년의 여름올림픽을 다시 개최할 수 있게 될까? 아직은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2011년 7월 13일자 매일경제>





